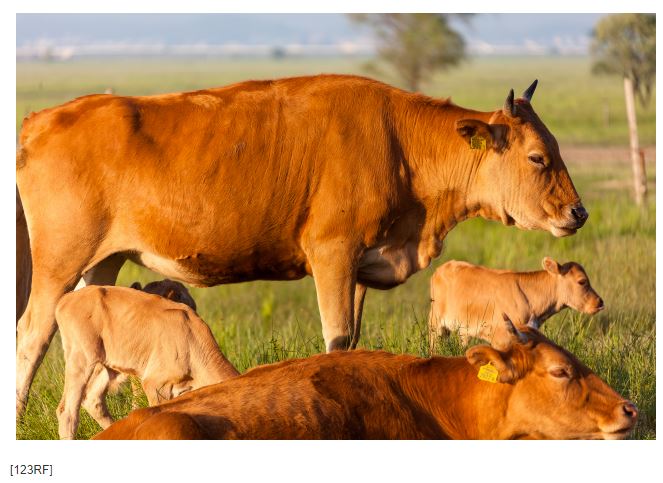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가축의 건강 상태와 식용 적정성을 검사하는 인력은 법적 권고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관은 총 236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축검사관 정원의 합계인 279명과 비교하면 15% 이상 부족한 규모다.
도축검사관은 생체 및 해체 검사를 통해 가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용으로 적합하지 여부를 판단한다. 도축검사관의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축산물로 판매될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장기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도 있지만, 채용 자체가 정원을 채울 만큼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정원부터가 실제 법이 권고하는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 30두, 돼지 300두, 닭 5만수 이하마다 1명의 검사관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전국 도축장에 권고되는 검사관 인력은 450명 이상인데, 현재 근무 인력은 그 절반에 그치고 있다.
도축검사관 부족 문제는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도축검사관 수는 218명으로, 당시 정원(242명) 대비 90%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근무 인력은 18명이 더 늘었으나, 정원 대비 근무율은 85%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육우 마릿수는 지난 2016년 296만3000마리에서 지난해 355만5000마리로 20.0% 급증했고, 닭 역시 1억7015만마리에서 1억7719만마리로 4% 이상 늘었다. 연간 도축 마릿수도 8.4%(86만1487→93만3861마리), 돼지 11.1%(1654만5747→1838만2767마리), 닭 4.3%(9억9256만→10억3564만마리)로 증가했다.
도축 검사관 부족 문제는 가축 전염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이뤄지는 동물 학대 사각지대를 키울 수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을위한행동’의 전채은 대표는 최근 한국의 농장동물 복지 실태의 심각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도축장 전·현직 검사관들을 인터뷰한 결과, 검사관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해 실제로 현장에서 도축 시스템 단계별로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산업 내의 종사자 수 감소와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이 농장에서의 동물 복지 저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06000883&ACE_SEARCH=1